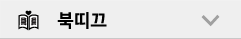해당작가 다른작품
- 선생님 사랑해..최홍하 지음
- 로망띠끄 (08/18)
- 3,500원
- Homme(옴므) ..최홍하 지음
- 로망띠끄 (01/26)
- 3,000원
- 가시 꽃 2권 ..최홍하 지음
- 로망띠끄 (03/28)
- 3,000원
- 가시 꽃 1권최홍하 지음
- 로망띠끄 (03/28)
- 3,000원
- K양 스캔들 최홍하 지음
- 로망띠끄 (05/31)
- 3,000원

[eBook]Homme(옴므) 2권

최홍하 지음로망띠끄2012.01.26
![]()

| 판매정가 | : |
|---|---|
| 판매가격 | : 3,000원 |
| 적 립 금 | : 60원 |
| 파일용량 | : 2.52 MByte |
| 이용환경 | : PC/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타블렛 |
| 독자평점 | : |
| 듣기기능 | : |
| ISBN | : 979-11-5760-129-5 |
뷰어 설치 및 사용안내
- * 이 상품은 별도의 배송이 필요없는 전자책(E-Book)으로 구매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북도서의 특성상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시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살.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으로 남자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조직 백호파에 들어가 남자는 오직 부모님의 복수만을 꿈꿔오며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산다. 그런데 9년이란 시간이 흘러 겨울처럼 차갑고 냉혈해진 남자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릴 적 눈꽃처럼 예쁘고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오로라를 뿜으며 신혁 앞에 나타났다.
한겨울. 이 아이. 변해버린 자신을 향해, 피 냄새로 뒤덮여진 자신을 향해……. 아직도 봄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겨울이란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봄 같이 따뜻한 그녀의 등장으로 9년간 복수로 무장한 신혁의 삶이 흔들리고 변하려한다.
최신혁
다정했던 어린 날의 그는 오로지 복수밖에 모르는 냉혈한 남자로 변했다. 백호파. 최 실장. 악랄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 남자. 하지만 겨울에겐 한 없이 다정한 봄 같은 남자이다.
한겨울
인생을 살아가기엔 그녀는 너무 순수했다. 가족도 외면한 아픈 기억을 신혁에게서 치유 받고 싶어 한다. 신혁 밖에 모르는 그녀. 아이에서 소녀로, 소녀에서 여자로. 여리기만 한 이 여자 사랑 앞에서 누구보다 강하다.
-본문 中에서-
“제발……. 가!”
“…….”
“나 너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겨울은 자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신혁을 보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신혁 앞으로 다가간 겨울은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그의 얼굴을 조심히 쓸어내렸다.
“울지 마.”
“…….”
“울지 마. 오빠.”
“…….”
“울지 마……”
신혁은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겨울의 손을 냉정하게 내쳤다.
“울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지금 네가 울고 있잖아!”
“오빤, 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잔인한 짓 못 하잖아. 속으로 아파하고 있잖아. 속으로 울고 있잖아.”
“……웃기는군. 네가 날 알아? 네가 날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신혁을 향해 겨울을 한 발짝 다가섰지만, 신혁은 한 발짝 물러나며 겨울을 밀어냈다.
“오지 마.”
“오빠. 신혁 오빠! 도망치지 마…….”
자꾸만 다가오는 겨울을 향해 신혁은 도망가며 다가오지 말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다가와 자신을 안아주는 겨울의 행동에 신혁은 밀어낼 수 없었다. 저를 대신해 울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신혁은 자신도 모르게 팔을 뻗어 겨울을 안아 버렸다.
“겨울아.”
“……흐흡……흐으윽.”
“우리 공주님…….”
“흐으……흐……오빠.”
저는 마음까지 더러워져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는데, 여전히 착한 겨울이 저 대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 깊이 안아준다.
썩어 문드러진 더러움을 치유하듯 따듯하게 퍼지는 그녀의 봄 같은 체온에 신혁은 눈을 감으며 겨울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겨울아…….”
“신혁 오빠…….”
한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겨울의 등을 쓸어내리며 신혁은 오랜만에 다정함이 묻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혁은 안고 있던 겨울을 잠시 떼어내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볼을 닦아주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 했던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겨울을 조심스레 눈에 담아보는 신혁이다.
여전히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에, 깨끗한 흰 피부. 울면서도 자신을 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입술까지. 어린 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사랑스럽고 눈꽃 같았던 아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돼있었다.
“우리 공주님, 여전히 예쁘네.”
다감하고 반가운 신혁의 목소리에 겨울은 부끄러운 듯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발그레 볼을 물들였다. 어렸을 때 처럼 겨울의 볼을 어루만지며 살짝 꼬집던 신혁은 아련한 눈빛을 띠우며 슬프게 웃었다.
겨울은 새하얗고, 자신은 새까맸다. 겨울과 예전처럼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 자신의 더러운 피가 깨끗한 겨울을 얼룩지게 할 것이 뻔 하기에.
[미리보기]
배를 채우고 바다로 나온 두 사람은 모래사장으로 내려와 고운 모래흙을 밟았다. 겨울은 신나게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잔잔한 파도가 흘러 들어오는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자신의 발을 적시는 시원함에 상쾌해진 겨울은 팔을 들어 허공위로 흔들며 신혁에게 이리로 오라며 손짓했다. 머뭇거리며 망설이던 신혁도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겨울 옆으로 다가섰다.
“오빠. 시원하지?”
고개를 끄덕이는 신혁을 향해 겨울이 물을 끼얹자, 그는 복수라도 하듯이 더 큰 바닷물을 겨울에게 끼얹었다. 요란하게 소릴 지르며 도망가는 겨울을 따라 신혁이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자 항복이라며 울상을 짓는 겨울이다. 물에 빠진 생쥐마냥 축축이 젖은 겨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하얗게 질려있자 장난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빛을 띠우며 신혁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틈을 놓치지 않고 겨울이 물을 신혁에게 뿌렸다. 장난기 가득한 겨울의 표정에 신혁은 오랜만에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겨울의 손을 붙잡았다.
“복수다. 한겨울.”
신혁이 겨울의 몸을 들더니 바다로 풍덩 빠트렸다. 어푸어푸 소리를 내며 빠진 겨울이 눈을 흘기고 신혁에게 돌진하자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다. 상체를 일으킨 신혁이 소리를 내 웃고 있는 겨울을 보며 밝게 웃었다. 소리를 내 웃어보던 게 얼마만일까? 신혁은 겨울에게 손을 뻗었다.
“일으켜줘.”
“나 안속아. 그 손잡으면 나 잡아당겨서 빠트릴 거잖아.”
“안 그럴게. 잡아줘.”
고민하던 겨울이 한번쯤 속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신혁은 잡은 겨울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겨 안았다. 바닷물에 빠질 거라 예상했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따뜻한 신혁에 품에 갇히자 겨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목소리에도 온기가 있는 것일까? 따스한 신혁의 목소리가 듣기 좋게 겨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고마워.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줘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는 신혁을 보며 겨울은 용기를 내고 그의 목에 팔을 둘러 안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자 신혁은 몸을 일으켜 겨울을 안은 채로 바다에서 나왔다. 신혁에게 매달려 안겨 있던 겨울은 허공으로 들리는 몸에 발버둥 치다가 그의 눈과 마주쳤다. 시선이 닿은 순간 겨울은 발버둥 치던 동작을 멈췄다. 피할 수도 없을 만큼 다정하고 짙은 그의 눈빛에 사로잡히듯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시간이 멈춘 기분이 들었다. 온 세상에 둘만 있는 기분.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는 두 사람의 공간에는 아무도 방해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었다.
“예쁘다.”
“내가?”
“아니. 네 뒤에 진 노을이.”
겨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붉게 물든 모래사장을 바라봤다.
“쳇. 나 이제 내려줘.”
그는 그녀를 모래사장 위에 내려 주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겨울의 모습을 눈에 담아내던 신혁은 손을 뻗어 겨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삐치지 마. 내 눈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네가 제일 예쁘니까.”
조직 백호파에 들어가 남자는 오직 부모님의 복수만을 꿈꿔오며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산다. 그런데 9년이란 시간이 흘러 겨울처럼 차갑고 냉혈해진 남자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릴 적 눈꽃처럼 예쁘고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오로라를 뿜으며 신혁 앞에 나타났다.
한겨울. 이 아이. 변해버린 자신을 향해, 피 냄새로 뒤덮여진 자신을 향해……. 아직도 봄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겨울이란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봄 같이 따뜻한 그녀의 등장으로 9년간 복수로 무장한 신혁의 삶이 흔들리고 변하려한다.
최신혁
다정했던 어린 날의 그는 오로지 복수밖에 모르는 냉혈한 남자로 변했다. 백호파. 최 실장. 악랄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 남자. 하지만 겨울에겐 한 없이 다정한 봄 같은 남자이다.
한겨울
인생을 살아가기엔 그녀는 너무 순수했다. 가족도 외면한 아픈 기억을 신혁에게서 치유 받고 싶어 한다. 신혁 밖에 모르는 그녀. 아이에서 소녀로, 소녀에서 여자로. 여리기만 한 이 여자 사랑 앞에서 누구보다 강하다.
-본문 中에서-
“제발……. 가!”
“…….”
“나 너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겨울은 자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신혁을 보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신혁 앞으로 다가간 겨울은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그의 얼굴을 조심히 쓸어내렸다.
“울지 마.”
“…….”
“울지 마. 오빠.”
“…….”
“울지 마……”
신혁은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겨울의 손을 냉정하게 내쳤다.
“울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지금 네가 울고 있잖아!”
“오빤, 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잔인한 짓 못 하잖아. 속으로 아파하고 있잖아. 속으로 울고 있잖아.”
“……웃기는군. 네가 날 알아? 네가 날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신혁을 향해 겨울을 한 발짝 다가섰지만, 신혁은 한 발짝 물러나며 겨울을 밀어냈다.
“오지 마.”
“오빠. 신혁 오빠! 도망치지 마…….”
자꾸만 다가오는 겨울을 향해 신혁은 도망가며 다가오지 말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다가와 자신을 안아주는 겨울의 행동에 신혁은 밀어낼 수 없었다. 저를 대신해 울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며 신혁은 자신도 모르게 팔을 뻗어 겨울을 안아 버렸다.
“겨울아.”
“……흐흡……흐으윽.”
“우리 공주님…….”
“흐으……흐……오빠.”
저는 마음까지 더러워져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는데, 여전히 착한 겨울이 저 대신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 깊이 안아준다.
썩어 문드러진 더러움을 치유하듯 따듯하게 퍼지는 그녀의 봄 같은 체온에 신혁은 눈을 감으며 겨울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겨울아…….”
“신혁 오빠…….”
한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겨울의 등을 쓸어내리며 신혁은 오랜만에 다정함이 묻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혁은 안고 있던 겨울을 잠시 떼어내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볼을 닦아주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 했던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겨울을 조심스레 눈에 담아보는 신혁이다.
여전히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에, 깨끗한 흰 피부. 울면서도 자신을 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입술까지. 어린 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사랑스럽고 눈꽃 같았던 아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돼있었다.
“우리 공주님, 여전히 예쁘네.”
다감하고 반가운 신혁의 목소리에 겨울은 부끄러운 듯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발그레 볼을 물들였다. 어렸을 때 처럼 겨울의 볼을 어루만지며 살짝 꼬집던 신혁은 아련한 눈빛을 띠우며 슬프게 웃었다.
겨울은 새하얗고, 자신은 새까맸다. 겨울과 예전처럼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 자신의 더러운 피가 깨끗한 겨울을 얼룩지게 할 것이 뻔 하기에.
[미리보기]
배를 채우고 바다로 나온 두 사람은 모래사장으로 내려와 고운 모래흙을 밟았다. 겨울은 신나게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잔잔한 파도가 흘러 들어오는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자신의 발을 적시는 시원함에 상쾌해진 겨울은 팔을 들어 허공위로 흔들며 신혁에게 이리로 오라며 손짓했다. 머뭇거리며 망설이던 신혁도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겨울 옆으로 다가섰다.
“오빠. 시원하지?”
고개를 끄덕이는 신혁을 향해 겨울이 물을 끼얹자, 그는 복수라도 하듯이 더 큰 바닷물을 겨울에게 끼얹었다. 요란하게 소릴 지르며 도망가는 겨울을 따라 신혁이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자 항복이라며 울상을 짓는 겨울이다. 물에 빠진 생쥐마냥 축축이 젖은 겨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하얗게 질려있자 장난을 멈추고 걱정스런 눈빛을 띠우며 신혁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틈을 놓치지 않고 겨울이 물을 신혁에게 뿌렸다. 장난기 가득한 겨울의 표정에 신혁은 오랜만에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겨울의 손을 붙잡았다.
“복수다. 한겨울.”
신혁이 겨울의 몸을 들더니 바다로 풍덩 빠트렸다. 어푸어푸 소리를 내며 빠진 겨울이 눈을 흘기고 신혁에게 돌진하자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다. 상체를 일으킨 신혁이 소리를 내 웃고 있는 겨울을 보며 밝게 웃었다. 소리를 내 웃어보던 게 얼마만일까? 신혁은 겨울에게 손을 뻗었다.
“일으켜줘.”
“나 안속아. 그 손잡으면 나 잡아당겨서 빠트릴 거잖아.”
“안 그럴게. 잡아줘.”
고민하던 겨울이 한번쯤 속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신혁은 잡은 겨울의 손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품 안으로 당겨 안았다. 바닷물에 빠질 거라 예상했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따뜻한 신혁에 품에 갇히자 겨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목소리에도 온기가 있는 것일까? 따스한 신혁의 목소리가 듣기 좋게 겨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고마워.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줘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는 신혁을 보며 겨울은 용기를 내고 그의 목에 팔을 둘러 안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오자 신혁은 몸을 일으켜 겨울을 안은 채로 바다에서 나왔다. 신혁에게 매달려 안겨 있던 겨울은 허공으로 들리는 몸에 발버둥 치다가 그의 눈과 마주쳤다. 시선이 닿은 순간 겨울은 발버둥 치던 동작을 멈췄다. 피할 수도 없을 만큼 다정하고 짙은 그의 눈빛에 사로잡히듯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시간이 멈춘 기분이 들었다. 온 세상에 둘만 있는 기분.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는 두 사람의 공간에는 아무도 방해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 되고 있었다.
“예쁘다.”
“내가?”
“아니. 네 뒤에 진 노을이.”
겨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붉게 물든 모래사장을 바라봤다.
“쳇. 나 이제 내려줘.”
그는 그녀를 모래사장 위에 내려 주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겨울의 모습을 눈에 담아내던 신혁은 손을 뻗어 겨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삐치지 마. 내 눈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네가 제일 예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