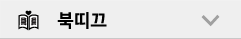해당작가 다른작품
- 비밀의 시간 ..수련粹戀 지음
- 로망띠끄 (11/27)
- 3,500원
- 꽃이 되어 나..수련粹戀 지음
- 로망띠끄 (08/02)
- 3,500원
- 썸타임 아프리..수련粹戀 지음
- 로망띠끄 (03/23)
- 3,000원
- 눈부신 고백 ..수련粹戀 지음
- 로망띠끄 (12/28)
- 7,000원
- 비밀의 시간 ..수련粹戀 지음
- 로망띠끄 (11/27)
- 7,000원

동일 장르 작품
- [합본] 옐로(..서미선 지음
- 더로맨틱 (02/18)
- 6,480원
- 깨어진 유리구..하서린 지음
- 러브홀릭 (04/06)
- 3,500원
- 그 농밀한 열..아리아 지음
- 로망띠끄 (07/14)
- 3,000원
- 8시간 성노예디도르 지음
- 일리걸 (03/29)
- 1,000원
- 사장님의 오나..꾸금 지음
- 일리걸 (05/31)
- 1,000원

분야 신간
- 함몰 유두 교..살구덕 지음
- 마들렌 (11/21)
- 1,000원
- 계단에서 XX하..홍최래 지음
- 희우 (11/18)
- 1,000원
- 죽은 소꿉친구..강로로 지음
- 희우 (11/18)
- 1,000원
- 캠퍼스 분수대..달마다 지음
- 희우 (11/18)
- 1,100원
- 선생님을 탐하..주황연 지음
- 새턴 (11/18)
- 3,400원
- 상실의 밤 1권..플루토a 지음
- 새턴 (11/18)
- 3,600원
[eBook][합본] 경성블루스 (전2권/완결)

수련粹戀 지음로망띠끄2017.03.23
![]()

| 판매정가 | : |
|---|---|
| 판매가격 | : 7,000원 |
| 적 립 금 | : 0원 |
| 파일용량 | : 2.88 MByte |
| 이용환경 | : PC/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타블렛 |
| 독자평점 | : |
| 듣기기능 | : |
| ISBN | : |
| UCI | : |
뷰어 설치 및 사용안내
- * 이 상품은 별도의 배송이 필요없는 전자책(E-Book)으로 구매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북도서의 특성상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시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인가? 익상은 문영에게 등을 보인 채로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빗속에서 그녀를 본 순간,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떻게 된 사태인지 머리가 깨닫는 순간 빠져나갔던 피가 되돌아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눈에서 확 불꽃이 일고 휙 그대로 꼭뒤가 돌아버리는 것 같았다. 일본 놈들에게 칼을 꽂을 때도, 거꾸로 자신이 칼을 맞을 때도 늘 차가웠던 머리와 가슴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사내가 아닐 것이라 거의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말로 그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은 스물일곱 해 동안 차가웠던 머리와 가슴을 한순간에 비웃어버렸다.
“……벗어라.”
익상은 젖을 대로 젖어 뚝뚝 빗물을 떨어뜨리는 조끼의 단추를 풀며 천천히 문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다 어두워진 그 밤에 왜 갑판 따위를 어슬렁거렸느냐, 화를 내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정리를 하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몸을 돌려 문영을 마주한 순간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아니 포주 놈을 더 아작 내버리지 못한 것에 가슴에 남아있던 화가 봄볕에 눈처럼 사그라지는 것 같았다.
“버, 벗다니요? 왭니까?”
버걱거리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물에 젖은 생쥐 꼴을 해가지고는 선실 문에 찰싹 달라붙어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폼이 물어뜯고 싶을 만큼 예뻤다, 젠장! 동시에 김익상! 네가 기어이 돈 것이로구나! 하는 자조가 함께 들지만, 그뿐이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젖은 조끼를 벗다말고 뚜벅뚜벅 문영에게 다가간 익상이 되물었다. 그러자 뜯어진 앞섶을 움켜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면서도 애써 익상의 눈을 외면하지 않은 문영이 재빨리 변명하듯 말한다.
“여, 여기는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방에서 가서.”
“그 꼴로?”
하지만 이내 자신의 모양새를 상기시켜주는 익상의 눈짓에 문영의 눈빛이 혼란스레 얽히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저 작은 머리통이 무엇을 생각하며 계산하는지 빤히 보이기까지 하였다. 포주 놈에게 된통 당할 뻔했던 일은 그새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신이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들켰는지 들키지 않았는지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것이리라. 귀엽다. 머리통을 굴리는 모양새가 아주 돌아버리게 귀엽고 예뻐서 가슴 가운데가 저릿저릿했다.
“입어.”
자꾸만 비실비실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익상은 가방에서 셔츠 하나를 꺼내 문영에게 던졌다.
“안 볼 테니까, 입어.”
“네, 네?”
“입으라고. 그 꼴로는 절대 네 방에 안 돌려보낼 테니까.”
등을 돌린 채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서 그냥 재빨리 갈아입으면…….”
그리고 문영의 말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배가 기우뚱거리며 문짝에 납작 붙어 있던 그녀가 미끄러져 익상의 품에 쿡 얼굴을 박은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선실 유리창에 세차게 부딪치는 빗소리도, 억센 비와 바람을 만나 파도에 휩쓸린 선채가 끼이 끼이 내는 쇳소리도 아득했다. 간이침대와 침대 사이, 그 좁은 틈에서 몸을 맞댄 두 남녀가 내는 거친 숨소리가 전부였다. 시간도 공기의 흐름도 모두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다시금 끼이 선채가 쇳소리를 내며 이번엔 반대편으로 기울었다. 쭈욱 힘없이 뒤로 미끄러지는 문영의 팔을 익상이 재빨리 낚아채었다.
이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혀들었다. 익상의 눈이 미끄러지듯 발갛게 상기된 뺨과 콧등의 작은 주근깨를 거쳐 밭은 숨을 내쉬는 입술로 내려와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추어버렸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이대로 입술을 훔쳐 짓이겨버리고 내쉬는 밭은 숨까지 모다 삼켜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점점 더 그녀를 향한 욕심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왜……, 떠는 거냐?”
문영이 기울어진 선채 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꽉 손목을 움켜쥐어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한테 이리 잡혀 있는 것이 불안하냐?”
알고 싶었다. 그녀도 자신처럼 숨이 막히고 혈관을 내달리는 피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지. 그 뜨거운 피가 모인 심장이 펄떡펄떡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뛰어대며 숨이 가쁘게 솟구치는지 익상은 알고 싶었다.
“이제부터.”
익상의 밑도 끝도 없는 짧은 물음에 뺨과 눈동자까지 열이 올라 벌겋게 달아오른 문영이 혼란스러운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는 문영의 답을 듣는 대신,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손목을 움켜쥐지 않은 다른 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이 다 닿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가린 머리카락을 머뭇머뭇 밀쳐냈다. 손이 다 닿아버리면 열이 올라 새빨갛게 달아오른 여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그대로 입술을 삼켜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는 빗물에 떨리는 나뭇잎처럼 떠는 다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입술 끝을 끌어올렸다.
“알아봐야겠다.”
펄떡이는 자신의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인 익상이 한 말이었다.
“뭘, 말입니까?”
온몸을 훑고 지나간 전율에 혼란스럽기 만한 문영이 물었다.
“내가 남색인지 아닌지.”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지금 네 입술을 뺏고 싶은 내가, 남색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말이야.”
그는 못 본 것이다. 빗속에서 옷이 뜯어져 앞섶이 벌어졌던 그 순간.
“하! 선배님!”
“기대해라. 내일부터 하나,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
아니. 익상은 잠시 미루어둔 것뿐이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충동대로 입술을 빼앗아버리면 그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릴 테니까. 어쩜 멀리 도망가 다시는 곁에도 오지 않으려 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녀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 척해야 할 때였다.
사내가 아닐 것이라 거의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말로 그녀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은 스물일곱 해 동안 차가웠던 머리와 가슴을 한순간에 비웃어버렸다.
“……벗어라.”
익상은 젖을 대로 젖어 뚝뚝 빗물을 떨어뜨리는 조끼의 단추를 풀며 천천히 문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다 어두워진 그 밤에 왜 갑판 따위를 어슬렁거렸느냐, 화를 내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정리를 하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몸을 돌려 문영을 마주한 순간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아니 포주 놈을 더 아작 내버리지 못한 것에 가슴에 남아있던 화가 봄볕에 눈처럼 사그라지는 것 같았다.
“버, 벗다니요? 왭니까?”
버걱거리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물에 젖은 생쥐 꼴을 해가지고는 선실 문에 찰싹 달라붙어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폼이 물어뜯고 싶을 만큼 예뻤다, 젠장! 동시에 김익상! 네가 기어이 돈 것이로구나! 하는 자조가 함께 들지만, 그뿐이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젖은 조끼를 벗다말고 뚜벅뚜벅 문영에게 다가간 익상이 되물었다. 그러자 뜯어진 앞섶을 움켜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면서도 애써 익상의 눈을 외면하지 않은 문영이 재빨리 변명하듯 말한다.
“여, 여기는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방에서 가서.”
“그 꼴로?”
하지만 이내 자신의 모양새를 상기시켜주는 익상의 눈짓에 문영의 눈빛이 혼란스레 얽히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 아예 저 작은 머리통이 무엇을 생각하며 계산하는지 빤히 보이기까지 하였다. 포주 놈에게 된통 당할 뻔했던 일은 그새 잊어버리고, 지금은 자신이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들켰는지 들키지 않았는지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것이리라. 귀엽다. 머리통을 굴리는 모양새가 아주 돌아버리게 귀엽고 예뻐서 가슴 가운데가 저릿저릿했다.
“입어.”
자꾸만 비실비실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익상은 가방에서 셔츠 하나를 꺼내 문영에게 던졌다.
“안 볼 테니까, 입어.”
“네, 네?”
“입으라고. 그 꼴로는 절대 네 방에 안 돌려보낼 테니까.”
등을 돌린 채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서 그냥 재빨리 갈아입으면…….”
그리고 문영의 말이 채 끝을 맺기도 전에 배가 기우뚱거리며 문짝에 납작 붙어 있던 그녀가 미끄러져 익상의 품에 쿡 얼굴을 박은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다. 선실 유리창에 세차게 부딪치는 빗소리도, 억센 비와 바람을 만나 파도에 휩쓸린 선채가 끼이 끼이 내는 쇳소리도 아득했다. 간이침대와 침대 사이, 그 좁은 틈에서 몸을 맞댄 두 남녀가 내는 거친 숨소리가 전부였다. 시간도 공기의 흐름도 모두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다시금 끼이 선채가 쇳소리를 내며 이번엔 반대편으로 기울었다. 쭈욱 힘없이 뒤로 미끄러지는 문영의 팔을 익상이 재빨리 낚아채었다.
이젠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혀들었다. 익상의 눈이 미끄러지듯 발갛게 상기된 뺨과 콧등의 작은 주근깨를 거쳐 밭은 숨을 내쉬는 입술로 내려와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추어버렸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이대로 입술을 훔쳐 짓이겨버리고 내쉬는 밭은 숨까지 모다 삼켜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점점 더 그녀를 향한 욕심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왜……, 떠는 거냐?”
문영이 기울어진 선채 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꽉 손목을 움켜쥐어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한테 이리 잡혀 있는 것이 불안하냐?”
알고 싶었다. 그녀도 자신처럼 숨이 막히고 혈관을 내달리는 피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지. 그 뜨거운 피가 모인 심장이 펄떡펄떡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뛰어대며 숨이 가쁘게 솟구치는지 익상은 알고 싶었다.
“이제부터.”
익상의 밑도 끝도 없는 짧은 물음에 뺨과 눈동자까지 열이 올라 벌겋게 달아오른 문영이 혼란스러운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는 문영의 답을 듣는 대신,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손목을 움켜쥐지 않은 다른 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이 다 닿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가린 머리카락을 머뭇머뭇 밀쳐냈다. 손이 다 닿아버리면 열이 올라 새빨갛게 달아오른 여자의 얼굴을 움켜쥐고 그대로 입술을 삼켜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는 빗물에 떨리는 나뭇잎처럼 떠는 다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입술 끝을 끌어올렸다.
“알아봐야겠다.”
펄떡이는 자신의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인 익상이 한 말이었다.
“뭘, 말입니까?”
온몸을 훑고 지나간 전율에 혼란스럽기 만한 문영이 물었다.
“내가 남색인지 아닌지.”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지금 네 입술을 뺏고 싶은 내가, 남색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말이야.”
그는 못 본 것이다. 빗속에서 옷이 뜯어져 앞섶이 벌어졌던 그 순간.
“하! 선배님!”
“기대해라. 내일부터 하나,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
아니. 익상은 잠시 미루어둔 것뿐이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충동대로 입술을 빼앗아버리면 그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릴 테니까. 어쩜 멀리 도망가 다시는 곁에도 오지 않으려 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녀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 척해야 할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