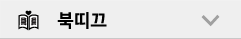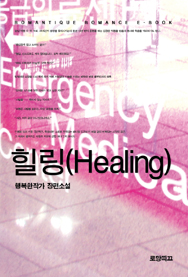해당작가 다른작품
- 이렇게 달콤해..행복한작가 지음
- 로망띠끄 (04/24)
- 3,500원
- 아찔하게 달콤..행복한작가 지음
- 로망띠끄 (04/11)
- 3,500원
- 키스하고 싶은..행복한작가 지음
- 로망띠끄 (07/03)
- 3,500원
- 힐링(Healing..행복한작가 지음
- 로망띠끄 (01/15)
- 3,500원
- 그녀를 위한 ..행복한작가 지음
- 로망띠끄 (02/06)
- 3,000원

동일 장르 작품
- 에로티카 단편..시나브로 지음
- 뉴시나브로 (07/18)
- 2,500원
- 연꽃의 색 (色..에레티 지음
- 로맨스토리 (11/30)
- 3,000원
- 반품 남녀권자영 지음
- 베아트리체 (12/04)
- 3,600원
- 크리스마스에..레니 로젤 지음
- 신영미디어 (03/22)
- 2,500원
- 가면의 추억에마 다시 지음
- 신영미디어 (02/18)
- 2,500원

[eBook]사랑을 찾다 

행복한작가 지음로망띠끄2014.04.03
![]()

| 판매정가 | : |
|---|---|
| 판매가격 | : 3,500원 |
| 적 립 금 | : 70원 |
| 파일용량 | : 2.63 MByte |
| 이용환경 | : PC/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타블렛 |
| 독자평점 | : |
| 듣기기능 | : |
| ISBN | : 979-11-258-3639-1 |
| UCI | : |
뷰어 설치 및 사용안내
- * 이 상품은 별도의 배송이 필요없는 전자책(E-Book)으로 구매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북도서의 특성상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시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뛰지 않는 심장을 안고 달린 한 남자.
“10년이나 지난 일이야.”
“아니. 나에게는 매일 어제 같은 기억이었어.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등신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이름 같은 거,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불러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끼고 참았던 거, 모조리 널 위해 해줬을 텐데!”
“그래서 이제 와 어떡하자고. 그래서 지금 네가 하자는 게 뭔데!”
“사랑!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불꽃 같은 남자 민강욱과 얼음 같은 여자 송윤재의 심장을 두드리는 사랑 이야기.
찍어낸 듯 닮은 미소.
함께 있어 익숙한 향취.
어쩌면 바다를 닮았을지 모른다는 두 사람에게 한 여자가 다가온다.
사내아이를 안아든 남자가 몸을 일으키며 여자에게로 다가서자 세 사람에게서 바다를 닮은 푸른 미소가 쏟아져 내린다.
가슴 가득 행복을 품은 그가 다시 바다를 향해 돌아서며 눈을 감는다.
그의 손끝에 두 사람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온다.
잠시 닫혀 있던 입가가 기분 좋은 호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그리고 그는 생각한다.
나는 사랑을 찾았다.
<본문 중에서>
“내 핸드폰 번호, 기억해?”
“어?”
“옛날 번호 그대로야.”
머릿속으로 빠르게 강욱의 전화번호를 되뇌어보았다.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열 개의 숫자.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눌러댔던 전화번호가 어제의 기억처럼 고스란히 그려지고 있었다. 놓칠 줄 알았던 무언가를 간신히 찾아 꼭 끌어안은 느낌이랄까. 어느새 완벽하게 조합된 숫자들에 안도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던 윤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놀라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제가 어떻게 한국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애써 끊어낸 기억의 편린을 떠올린 윤재가 파르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간신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번호가 뭐더라? 워낙 오래됐잖아.”
“……그래. 오래되었지.”
강욱이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었다.
“네 핸드폰.”
“아, 그게.”
“싫어? 그럼 집까지 같이 가든가.”
“강욱아.”
“실은 지금 나, 미칠 것 같거든!”
갑자기 얼굴을 굳히는 강욱을 윤재가 당황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불끈 참는 듯 관자놀이 근처가 씰룩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일단 나가자.”
덥석 윤재의 손목을 잡은 강욱이 걸음을 옮기며 낮은 음성으로 말을 뱉었다. 어떠한 반항의 몸짓도, 아무런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윤재가 그대로 강욱의 손에 이끌려 카운터 앞에 섰다. 윤재의 손목을 쥔 채 한 손으로 안주머니의 지갑을 꺼내 계산을 마친 강욱이 빠른 걸음으로 커피숍 문을 나섰다.
성큼성큼 움직이는 강욱의 보폭을 따라가고자 윤재는 10년 전, 강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그의 손에 이끌려 매점으로 향하던 그날처럼 거의 뛰다시피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다.
“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머니에서 꺼낸 리모컨이 강욱의 손안에서 삐빅, 소리를 내자 곧이어 라인 안에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던 검은 BMW가 얌전히 비상등을 깜빡였다. 조수석 문을 열어 윤재의 어깨에 손을 얹은 강욱이 힘을 실어 윤재를 차에 태우곤 빠른 걸음으로 돌아와 자신도 운전석에 몸을 올렸다.
“집이 어디야.”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강욱이 그대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윤재를 향해 물었다.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던 윤재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집이 어디야.”
채근하듯 물어오는 강욱의 반복된 질문에 그제야 강욱을 쏘아본 윤재가 바르르 떨리던 입술을 떼었다.
“나쁜 새끼.”
갑자기 튀어나온 욕설에도 강욱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 너 잘났다. 이 차도 네 거였니? 진짜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어. 너는 성공했고, 나는 지금 이 꼬라지야.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 나 어디 사냐고? 보증금 700에 월 20짜리 옥탑방 산다. 그래서 가르쳐주기 싫었어. 자존심 상해서 피하고 싶었다고. 모른 척 외면하면 눈치껏 알아먹어야지 꼭 이렇게 사람 꼴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서 시원해?”
참았던 눈물이 터지듯 흘러내렸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강욱의 탓인 양 그악스럽게 달려드는 윤재를 강욱이 와락 끌어안았다.
“놔!”
말아 쥔 주먹으로 강욱의 어깨와 등을 마구 두드리는 윤재를 강욱은 그저 힘주어 안고 있을 뿐이었다.
“윤재야.”
한참을 버둥대다 제풀에 지친 듯 몸을 축 늘인 채 제 품에 기댄 윤재의 등에 손을 얹은 강욱이 나직이 윤재의 이름을 불렀다.
“돈이 진짜 좋긴 좋은가 보다. 그땐 그렇게 불러달라고 떼써도 안 해주던 걸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 보면. 아니,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건가.”
“내가 겪은 10년이 지옥이라서 그랬어. 꼭 지옥 같아서.”
“그랬니. 제발 그 지옥, 나도 한 번 겪게 해주라. 겪고 나면 나도 너처럼 달라져 있을까.”
허공에 시선을 꽂은 윤재가 아무 감정을 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뻐끔대듯 입을 열었다. 힘겨웠을 윤재의 삶이 느껴졌다. 말없이 윤재의 등을 토닥이던 강욱은 깡말라 날개 뼈가 잔뜩 도드라진 윤재의 등이 안타까운 듯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어 내렸다.
“피곤할 텐데, 일단 가자.”
아쉬운 손길을 떼어낸 강욱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어디로 가면 돼?”
잠시 침묵하던 윤재가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