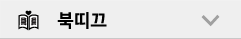해당작가 다른작품
- 사랑을 기다리..수니(秀馜) 지음
- 로망띠끄 (06/18)
- 3,500원
- 프러포즈 pro..수니(秀馜) 지음
- 로망띠끄 (10/14)
- 3,600원
- 선물수니(秀馜) 지음
- 로망띠끄 (12/08)
- 3,500원
- 길 위의 연인수니(秀馜) 지음
- 로망띠끄 (06/02)
- 3,500원
- 나의 신부에게..수니(秀馜) 지음
- 로망띠끄 (11/09)
- 3,500원

[eBook]햇살을 던지다

수니(秀馜) 지음로망띠끄2013.01.24
![]()

| 판매정가 | : |
|---|---|
| 판매가격 | : 3,500원 |
| 적 립 금 | : 70원 |
| 파일용량 | : 2.59 MByte |
| 이용환경 | : PC/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타블렛 |
| 독자평점 | : |
| 듣기기능 | : |
| ISBN | : |
| UCI | : |
뷰어 설치 및 사용안내
- * 이 상품은 별도의 배송이 필요없는 전자책(E-Book)으로 구매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북도서의 특성상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시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다. 난 적어도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라고 믿었어.”
제길! 시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 끝까지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
가까스로 그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의 인내심마저 툭 끊어져 버렸다.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지금껏 이토록 그를 열 받게 하는 여자도 없었다.
“그러는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얼마나 잘났기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누가 너더러 몰래 날 지켜달라고 했어? 나 때문에 툭하면 눈이 벌게져 있는 널 보면서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굴 동정해, 이 여자야!”
“거……지 같아.”
연희는 죽을힘을 다해 이를 앙 다물고 있지만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맑은 눈동자 안에 언뜻 물기가 비쳤다. 순간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이었다. 가끔 슬픈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눈물은 처음이었다. 절대 울지 않을 여자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연희의 눈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준혁의 심장도 마구 찌르는 것만 같았다.
“빌어먹을!”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준혁은 연희를 와락 당겨 안았다. 그리고 연희가 미처 밀어낼 새도 없이 거칠게 입술을 포갰다.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울음이 새어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까지 볼 자신이 없었다.
‘놔!’
연희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입안으로 삼켜졌다. 연희는 양팔에 힘을 주어 준혁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준혁의 억센 손이 그녀의 목 뒤로 가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녀의 입술을 아플 만큼 강하게 짓이겼다. 연희는 몸을 비틀고 주먹을 쥔 채 준혁의 등을 마구 때렸다. 그럴수록 준혁의 입술은 더 집요하게 연희의 입술을 탐했다. 그의 기세에 입술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도 느껴졌다.
“……울지 마. 제발……울지 마.”
맞닿은 입술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녀보다 더 아파 보였다.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일어났다.
“이럴 줄……알았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당신 눈치 따위 안 봤을 거잖아……. 마음 다칠까 봐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을 거고, 울 것 같은 그따위 표정 안 봐도 되었……잖아.”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그의 탁한 목소리에서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야 해.’
그런데 화를 낼 수 없었다. 거칠고 음울한 눈동자 속에 갇힌 그의 상처가 보여서, 그 상처가 낯설지 않아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상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버둥거리던 연희의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져나갔다. 연희는 준혁의 등을 때리던 주먹을 스르르 풀고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순간,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던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연희의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친 파도처럼 거침없던 준혁의 눈빛에서 분노가 빠져나갔다. 준혁은 입술만 맞붙인 채 거친 숨결을 가다듬었다. 연희는 딱딱하게 경직된 준혁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
그의 숨결이 조금씩 평정을 찾아간다고 느껴질 즈음, 준혁의 키스도 부드러워졌다. 준혁은 혀로 연희의 터진 입술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아랫입술을 꼼꼼히 쓸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입술의 감촉만으로 그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맞춤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달콤했다. 바위처럼 거칠면서도 부드러웠고, 가을낙엽처럼 성마르면서도 촉촉했다. 성난 파도처럼 제멋대로이면서 조심스러웠고,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다. 종잡을 수 없는 그와 똑같았다.
제길! 시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 끝까지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
가까스로 그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남은 한 자락의 인내심마저 툭 끊어져 버렸다.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지금껏 이토록 그를 열 받게 하는 여자도 없었다.
“그러는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얼마나 잘났기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누가 너더러 몰래 날 지켜달라고 했어? 나 때문에 툭하면 눈이 벌게져 있는 널 보면서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굴 동정해, 이 여자야!”
“거……지 같아.”
연희는 죽을힘을 다해 이를 앙 다물고 있지만 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맑은 눈동자 안에 언뜻 물기가 비쳤다. 순간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이었다. 가끔 슬픈 눈빛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눈물은 처음이었다. 절대 울지 않을 여자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연희의 눈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준혁의 심장도 마구 찌르는 것만 같았다.
“빌어먹을!”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준혁은 연희를 와락 당겨 안았다. 그리고 연희가 미처 밀어낼 새도 없이 거칠게 입술을 포갰다.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울음이 새어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까지 볼 자신이 없었다.
‘놔!’
연희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입안으로 삼켜졌다. 연희는 양팔에 힘을 주어 준혁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준혁의 억센 손이 그녀의 목 뒤로 가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녀의 입술을 아플 만큼 강하게 짓이겼다. 연희는 몸을 비틀고 주먹을 쥔 채 준혁의 등을 마구 때렸다. 그럴수록 준혁의 입술은 더 집요하게 연희의 입술을 탐했다. 그의 기세에 입술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도 느껴졌다.
“……울지 마. 제발……울지 마.”
맞닿은 입술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녀보다 더 아파 보였다.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일어났다.
“이럴 줄……알았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당신 눈치 따위 안 봤을 거잖아……. 마음 다칠까 봐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을 거고, 울 것 같은 그따위 표정 안 봐도 되었……잖아.”
울분을 토해내는 듯한 그의 탁한 목소리에서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야 해.’
그런데 화를 낼 수 없었다. 거칠고 음울한 눈동자 속에 갇힌 그의 상처가 보여서, 그 상처가 낯설지 않아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상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버둥거리던 연희의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져나갔다. 연희는 준혁의 등을 때리던 주먹을 스르르 풀고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순간,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있던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연희의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친 파도처럼 거침없던 준혁의 눈빛에서 분노가 빠져나갔다. 준혁은 입술만 맞붙인 채 거친 숨결을 가다듬었다. 연희는 딱딱하게 경직된 준혁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어루만져 주고 싶었다.
그의 숨결이 조금씩 평정을 찾아간다고 느껴질 즈음, 준혁의 키스도 부드러워졌다. 준혁은 혀로 연희의 터진 입술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아랫입술을 꼼꼼히 쓸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의 입술의 감촉만으로 그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입맞춤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달콤했다. 바위처럼 거칠면서도 부드러웠고, 가을낙엽처럼 성마르면서도 촉촉했다. 성난 파도처럼 제멋대로이면서 조심스러웠고,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다. 종잡을 수 없는 그와 똑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