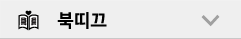해당작가 다른작품
- 지독한 기다림..정서영 지음
- 로망띠끄 (06/05)
- 3,000원
- 참 잘했습니다..정서영 지음
- 로망띠끄 (06/17)
- 3,000원
- 반쪽 별 2권정서영 지음
- 로망띠끄 (02/06)
- 3,500원
- 다이어리 정서영 지음
- 로망띠끄 (11/22)
- 3,500원
- 깊은 밤을 두..정서영 지음
- 로망띠끄 (04/04)
- 3,500원

동일 장르 작품
- 섹시 보스 (무..백화百花 지음
- 시크릿e북 (01/28)
- 7,000원
- 결혼적령기(외..령후 지음
- 러브홀릭 (07/02)
- 3,500원
- 낚시대에 걸린..이진희 지음
- 러브홀릭 (05/06)
- 3,500원
- 과외만 할랬는..솔까 지음
- 원샷(OneShot) (07/29)
- 1,200원
- 똥차 가고 벤..노젠맛쿠키 지음
- 12어클락 (08/28)
- 1,000원

[eBook]타닥타닥

정서영 지음로망띠끄2012.05.17
![]()

| 판매정가 | : |
|---|---|
| 판매가격 | : 3,500원 |
| 적 립 금 | : 70원 |
| 파일용량 | : 2.57 MByte |
| 이용환경 | : PC/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타블렛 |
| 독자평점 | : |
| 듣기기능 | : |
| ISBN | : |
| UCI | : |
뷰어 설치 및 사용안내
- * 이 상품은 별도의 배송이 필요없는 전자책(E-Book)으로 구매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북도서의 특성상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매하시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소개]
정서영(정문영)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쑥스럽기만 하고
글을 읽는 이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으나
그것이 버겁기만 하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으며
자신이 쓴 글이 만족스러운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더 많기만 하다.
그래서 오늘도 난 노력한다.
[작품소개]
같은 아픔을 가진,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났다.
차갑게 다른 곳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서로의 등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다.
“타닥타닥.”
“무슨 말이야?”
“나무가 타들어가면서 내는 소리요. 들어봐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귓가에 닿는 서연의 말에 태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만히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음,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들리네.”
“내게 있어 타닥타닥의 의미는 지금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생각지 못한 말에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말이 들려왔다.
“타닥타닥이라는 단어에는 힘없이 발을 떼어 놓으며 느리게 걷는 걸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하 씨를 만나기 전의 타닥타닥은 힘없이 내딛는 걸음의 타닥타닥이었고, 태하 씨를 만난 후의 타닥타닥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되었어요.”
“타닥…… 타닥.”
그녀의 말이 옳았다. 주서연을 만나기 전의 타닥타닥은 힘없이 지쳐 마지못해 내딛는 걸음의 타닥타닥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후 그 의미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되었다.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었다.
타닥타닥 튀는 불꽃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이 힘없이 타닥타닥 걸음을 내딛던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걷게 되며 생긴 변화였다.
[책 속에서]
굳어있던 몸이 풀린 듯 고개를 돌리려 하는 그녀의 앞을 막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바람에 그녀의 흔들리고 있는 그 눈동자를 고스란히 바라보게 되었다.
“집에 가.”
“잠깐만 비켜 봐요.”
“주서연. 내 말 들어.”
“비켜. 비키라는 내 말 못 알아들어!”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그녀는 지금 이 곳이 촬영장이라는 것도, 그 바람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한순간 쏠렸다는 것도 모르는 듯 했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손을 풀어내는 그녀가 얼마나 손에 힘을 주었는지 그녀의 손톱이 손에 파고들며 강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럼에도 손을 뗄 수 없었다.
심정 같아서는 그녀를 가슴에 안아 아무것도 못 보게,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끌어안아 구설수에 오르게 할 수 없었다.
“내 말…… 들어. 제발.”
귓가에 전해진 그의 나직한 말에 그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하던 팔에 힘이 빠졌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날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간절함이, 귓가에 들렸던 제발이라는 단어가 주던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허나, 그 간절함은 금세 깨어지고 말았다.
“태하 씨, 거기서 뭐해요. 여기 특별한 태하 씨 도시…… 서, 서연아.”
아래로 축 늘어트린 손에 들어 올려 그를 밀어냈다.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일까? 그는 물러나지 않은 채 얼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는 대신 돌아서서 몸으로 시야를 막았다. 하지만 귓가에 파고드는 목소리까지는 막지 못했다. 온 몸에 힘이 빠져 서있는 것이 버거워 그를 밀쳐내던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날 바라봤다.
“괜찮아?”
말을 거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날 바라보는 그의 걱정이 담긴 것이라 믿고 싶은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흐려져 가는 기억 속에 그 날의 일이 방금 전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억하려 애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 날의 일이. 그리고 그대로 암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주서연!”
더 이상 하얗게 변할 수 없을 만큼 굳은 그녀의 얼굴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이러 저리 흔들리는 눈동자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김과 동시에 풀썩, 그녀의 양팔을 잡고 있는 내게로 쓰러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주서연!”
품 안에서 축 늘어진 그녀의 모습에 이곳이 촬영장이고, 보는 이목이 많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져버렸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지만 들리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그녀를 안아 올렸다.
[덧, 각각의 장은 두 사람의 시점이 교차합니다.]
정서영(정문영)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쑥스럽기만 하고
글을 읽는 이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으나
그것이 버겁기만 하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으며
자신이 쓴 글이 만족스러운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더 많기만 하다.
그래서 오늘도 난 노력한다.
[작품소개]
같은 아픔을 가진,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났다.
차갑게 다른 곳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서로의 등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다.
“타닥타닥.”
“무슨 말이야?”
“나무가 타들어가면서 내는 소리요. 들어봐요. 타닥타닥. 타닥타닥.”
귓가에 닿는 서연의 말에 태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만히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음, 그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들리네.”
“내게 있어 타닥타닥의 의미는 지금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생각지 못한 말에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말이 들려왔다.
“타닥타닥이라는 단어에는 힘없이 발을 떼어 놓으며 느리게 걷는 걸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하 씨를 만나기 전의 타닥타닥은 힘없이 내딛는 걸음의 타닥타닥이었고, 태하 씨를 만난 후의 타닥타닥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되었어요.”
“타닥…… 타닥.”
그녀의 말이 옳았다. 주서연을 만나기 전의 타닥타닥은 힘없이 지쳐 마지못해 내딛는 걸음의 타닥타닥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난 후 그 의미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되었다.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었다.
타닥타닥 튀는 불꽃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이 힘없이 타닥타닥 걸음을 내딛던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걷게 되며 생긴 변화였다.
[책 속에서]
굳어있던 몸이 풀린 듯 고개를 돌리려 하는 그녀의 앞을 막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바람에 그녀의 흔들리고 있는 그 눈동자를 고스란히 바라보게 되었다.
“집에 가.”
“잠깐만 비켜 봐요.”
“주서연. 내 말 들어.”
“비켜. 비키라는 내 말 못 알아들어!”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그녀는 지금 이 곳이 촬영장이라는 것도, 그 바람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한순간 쏠렸다는 것도 모르는 듯 했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손을 풀어내는 그녀가 얼마나 손에 힘을 주었는지 그녀의 손톱이 손에 파고들며 강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럼에도 손을 뗄 수 없었다.
심정 같아서는 그녀를 가슴에 안아 아무것도 못 보게,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끌어안아 구설수에 오르게 할 수 없었다.
“내 말…… 들어. 제발.”
귓가에 전해진 그의 나직한 말에 그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 하던 팔에 힘이 빠졌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날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간절함이, 귓가에 들렸던 제발이라는 단어가 주던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허나, 그 간절함은 금세 깨어지고 말았다.
“태하 씨, 거기서 뭐해요. 여기 특별한 태하 씨 도시…… 서, 서연아.”
아래로 축 늘어트린 손에 들어 올려 그를 밀어냈다.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일까? 그는 물러나지 않은 채 얼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는 대신 돌아서서 몸으로 시야를 막았다. 하지만 귓가에 파고드는 목소리까지는 막지 못했다. 온 몸에 힘이 빠져 서있는 것이 버거워 그를 밀쳐내던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날 바라봤다.
“괜찮아?”
말을 거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날 바라보는 그의 걱정이 담긴 것이라 믿고 싶은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흐려져 가는 기억 속에 그 날의 일이 방금 전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억하려 애써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 날의 일이. 그리고 그대로 암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주서연!”
더 이상 하얗게 변할 수 없을 만큼 굳은 그녀의 얼굴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채 이러 저리 흔들리는 눈동자에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김과 동시에 풀썩, 그녀의 양팔을 잡고 있는 내게로 쓰러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주서연!”
품 안에서 축 늘어진 그녀의 모습에 이곳이 촬영장이고, 보는 이목이 많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져버렸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지만 들리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진 그녀를 안아 올렸다.
[덧, 각각의 장은 두 사람의 시점이 교차합니다.]